|
|

|
기고문 - 고녕가야와 고령가야
(글) - 김병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20일(목) 12:41 입력 : 2023년 04월 20일(목) 12:4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6백여 년간 존재했던 가야 역사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구려 신라 백제와 같이 저마다 왕이 통치를 하며 앞선 철기 문화와 토기 제작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활발한 대외활동까지 하던 가야국이 부활의 몸짓을 시작하고 있다. 있는 것을 덮어둔 것도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문경 상주지방에 걸쳐 있으면서도 이름만 회자하고 실체는 희미해진 그 나라를 얼마나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가?
한자로는 “古寧伽倻”라 쓴 다음, “고녕가야”, 또 누군 “고령가야”라고 읽는다. 동명이국(同名異國)이 아니라 이명동국(異名同國)이라서 왠지 불편함을 느끼는 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나라 명칭에 대해 어떻게 부르는 게 옳은지 한번쯤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다가오는 5월2일엔 상주함창과 문경 합동으로 제4차 가야국 학술 세미나를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그 홍보물에는 “고녕(고령)가야”로 표기하여 양수겸장을 치고 있으니 이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한국땅이름학회를 이끌고 있는 배우리 교수는 우리나라 땅이름과 관련한 최고의 권위자다. 그분은 “지명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음성학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명은 단순히 글자 자체의 의미와 정확한 발음에 얽매이지 말고 지명의 어원과 음운학적 현상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어란 사전에 한번 실리면 진리처럼 영원불변이 아니라 세속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습성이 있다. 그 변화는 의도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언중들에게 부르기 좋고 쓰기 쉬우며 서로 뜻이 잘 통하면 그 지명은 영속성을 갖는다는 말이다. 발음 시 혀가 불편하고 사용 시 철자 오류가 생기며 의미의 혼돈마저 불러일으킨다면 그 지명은 바뀔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마니산이 있는 섬을 우리는“강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지명은 원래 “강(江)+곶(串)+이”가 그 어원이다. 분명히 섬이지만 염하강과 임진강에 접하는 하나의 곶으로 인식되어 “강곶이”라고 부르다가 지명을 발음하기 힘들어지면서 “강꽃이”로 변하게 된다. 여기서 “~꽃이”의 “꽃”이 다시 “화(花)에서 화(華)”로 변하여 결국 오늘날의 ”강화(江華)“ 라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녕”과 “고령”으로 혼용되고 있는 두 지명 중 어느 것이 옳은가? 그 답은 미안하지만 둘 다 정답이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는 국문법에서 그 고유성을 인정해 예외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였던 선동열, 그의 이름 표기가 선동렬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름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의 마음이고, 대통령의 이름도 “윤석열”로 쓰고 있지만, 본인이 “윤석렬”로 쓴다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고녕이나 고령은 그 어느 것을 쓰더라도 문법상으로는 무방하다.
함창읍 증촌리에 있는 가야국 태조 왕릉의 안내판에는 “고령가야”로 표기하고 있는데, 요즘엔“고녕가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명은 고유명사이므로 맞춤법이 잘못되지 않았으니 전혀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배우리 교수의 말에 따라 구강구조가 달라지는 음성학적 측면에서 두 지명을 발음해 보면 혀가 다르게 느껴진다. “고녕”과 “고령”중 어느 지명이 더 발음하기 쉬운가?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는 사람들이 억지로 고녕이라 부르도록 해도 발음하기 힘들어지면 다시 고령으로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경 상주사람들은 왜 굳이 고녕을 고집할까? 그것은 6가야 중 하나인 대가야가 고령에 있어, 우리가 고령가야라고 부르면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대가야와 혼동할 수 있고, 나름 이곳 사람들의 자기 것에 대한 강한 자존심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대가야는 고령(高靈)에 있고, 고령(古寧)가야는 문경 상주지방에 있다는 것을 이 고장에 사람들은 정확히 알겠지만 다른 곳 사람들은 고령가야가 고령에 있거나 혹자는 진주에 있다고 믿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가야국의 명칭은 나라가 생길 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후에 역사 기술을 위해 부친 것으로 대소(大小)로 구분하거나, 나라가 있던 그 지역명을 따서 지었다. 함창의 옛 지명인 고릉(古陵)의 ‘고(古)’와 중국의 왕들이 연호로 즐겨 사용하는 함녕(咸寧)의 ‘녕(寧)’, 고려 때 함창인 “함녕(咸寧)”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언급한 “고녕과 고령”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활음조현상을 먼저 이해하면 된다. 발음의 “활음조(滑音調)현상”이란 한 단어 또는 두 단어가 이어질 때 인접한 음소(音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발음하기가 어렵고 듣기 거슬리는 소리에 어떤 소리를 더하거나 바꾸어, 발음하기가 쉽고 듣기 부드러운 소리로 되게 하는 음운 현상이다. ‘곤난 → 곤란, 허낙 → 허락, 희노 → 희로, 한 안음→ 한아름’ 따위가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불협화음을 화음으로 바꾸게 되는 현상이다.
문경상주 지방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힘주는 소리의 “응”은 잘 내면서도 “으”발음은 잘 안된다. 그것은 언어의 편의성이 그만큼 익숙하다는 말이다. 자연의 소리, 쉬운 소리가 토박이 언어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오래 사용하게 되는 지명이 된다. 꿀벌이 꽃 5,600송이와 만나야 벌꿀 한방울을 얻듯, 우리가 5천6백번 말해도 혀가 편해야 변치 않는 하나의 지명이 탄생됨을 알도록 하자. 언어는 도 아니면 개, 개 아니면 도를 선택하는 게 아닌 자연의 소리에 어떤 말이 더 가까운지를 생각하면 그 답은 보인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최신뉴스
|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남도청 방..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남도청 방.. |
 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 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 |
 유아들이 빚은 자연의 향기, 천.. 유아들이 빚은 자연의 향기, 천.. |
 문경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 문경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 |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8월 23..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8월 23.. |
 문경시 새마을회,‘2025 새마.. 문경시 새마을회,‘2025 새마.. |
 주민 가까이 다가선 제2민원실,.. 주민 가까이 다가선 제2민원실,.. |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 |
 문경시, 2025년 을지연습 실.. 문경시, 2025년 을지연습 실.. |
 6.25 전쟁 영웅 박동진 중사.. 6.25 전쟁 영웅 박동진 중사.. |
 문경시, ‘소규모 마을 활성화사.. 문경시, ‘소규모 마을 활성화사.. |
 문경시, 청춘 만남 주선 프로그.. 문경시, 청춘 만남 주선 프로그.. |
 [ 명사칼럼 ] 특별사면권은 이.. [ 명사칼럼 ] 특별사면권은 이.. |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 |
 임이자 기재위원장 , 문경 ‧ .. 임이자 기재위원장 , 문경 ‧ .. |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을지..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을지.. |
 모전초,‘제49회 대한민국관악경.. 모전초,‘제49회 대한민국관악경.. |
 ‘돌아온 맥가이버’ 문경미래교육.. ‘돌아온 맥가이버’ 문경미래교육..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어.. |
 웃음과 교육의 공존, 농업인 재.. 웃음과 교육의 공존, 농업인 재.. |
 별이 빛나는 밤! 이웃과 함께 .. 별이 빛나는 밤! 이웃과 함께 .. |
 봉숭아 사랑.. 봉숭아 사랑.. |
 4,500명이 열광한 2025 .. 4,500명이 열광한 2025 .. |
 (재)문경시장학회, 따뜻한 나눔.. (재)문경시장학회, 따뜻한 나눔.. |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 |
 문경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축.. 문경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축.. |
 점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 점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 |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 |
 경북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 경북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 |
 경북도, 예천에 글로벌 브랜드 .. 경북도, 예천에 글로벌 브랜드 .. |
 창의 융합 영재캠프, 미래 리더.. 창의 융합 영재캠프, 미래 리더.. |
 문창고, 2025 SW미래채움 .. 문창고, 2025 SW미래채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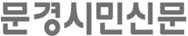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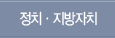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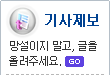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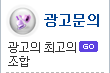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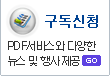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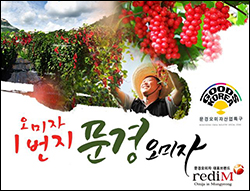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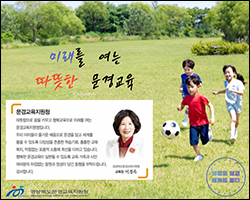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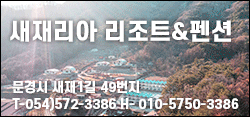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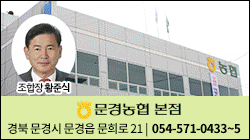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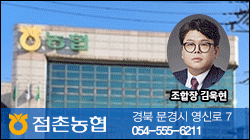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